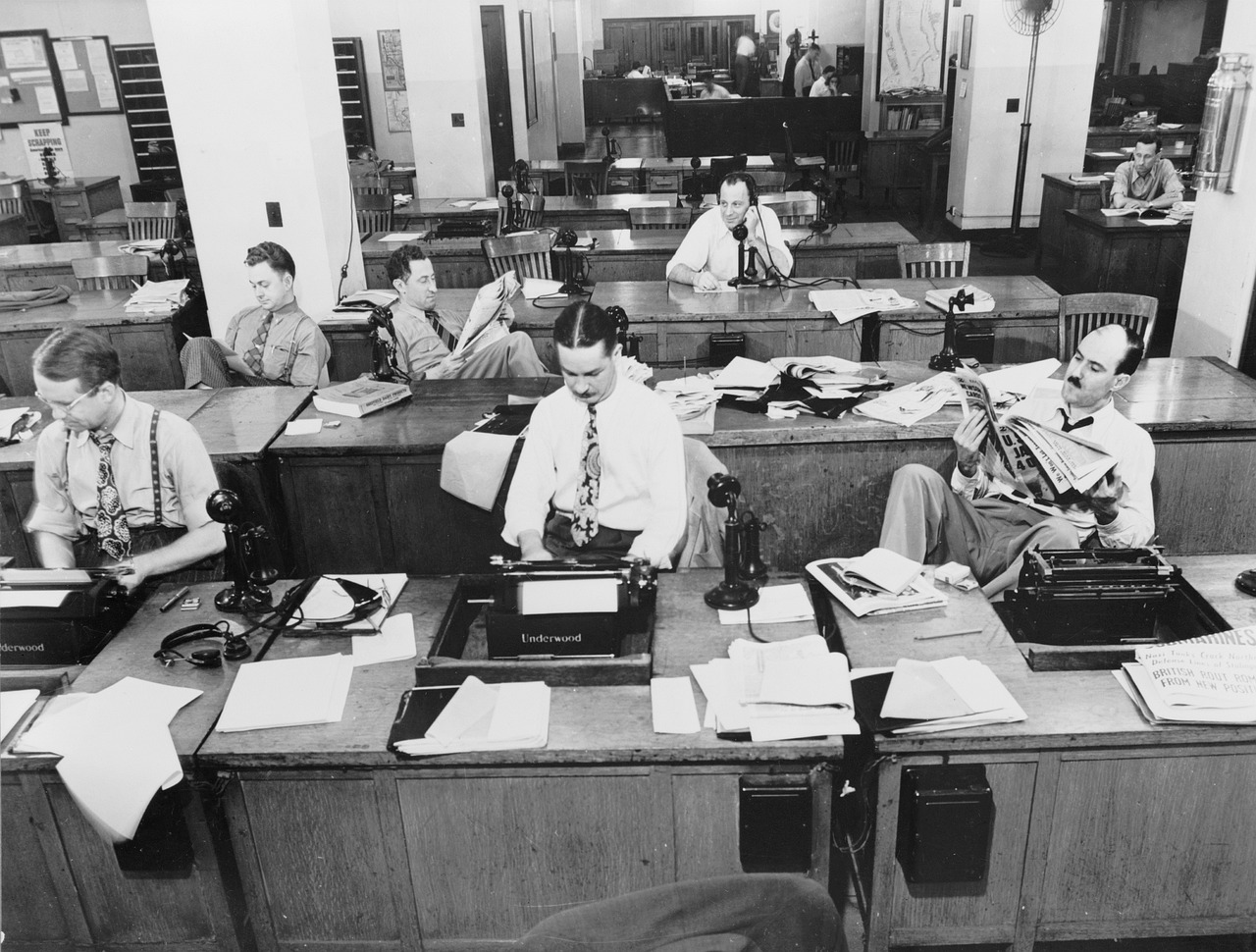"소수를 위한 기자가 되겠습니다"
첫 언론사 면접에서 했던 기자의 말이다. 목소리가 사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 이들의 입이 되겠다는 소신을 담은 각오였지만 당시 면접관이었던 국장의 한 질문에 우왕좌왕 어버버하고 말았다.
"그 소수가 누군가요?"
구체적이지도, 알맹이 없던 소신은 기자가 된 이후 점점 가슴을 깊이 짓누르기 시작했다. 기자가 된 후 9개월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무척이나 즐거웠지만, 입사 전 생각했던 '소신'과는 거리가 멀어졌다. 하루하루 쫓기듯 발제 기사를 쏟아내야 했고, 출입처를 관리하며, 또 선배와 데스크의 갈굼을 견디다보면 그 소신은 점점 감정의 사치품처럼 멀어져갔다.
'기레기'
기자가 되기 전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였던 이 멸칭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폭발적으로 다가왔다. 특히 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사건은 새내기 기자였던 나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,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강압적으로 끌고 간 일은 같은 기자로서 분노를 느끼게 했다.
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. 기사의 옳고 그름이나 기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이도 있었지만 '우리 편이 아니다'라는 이유로도 '기레기'라는 표현은 마구잡이로 사용됐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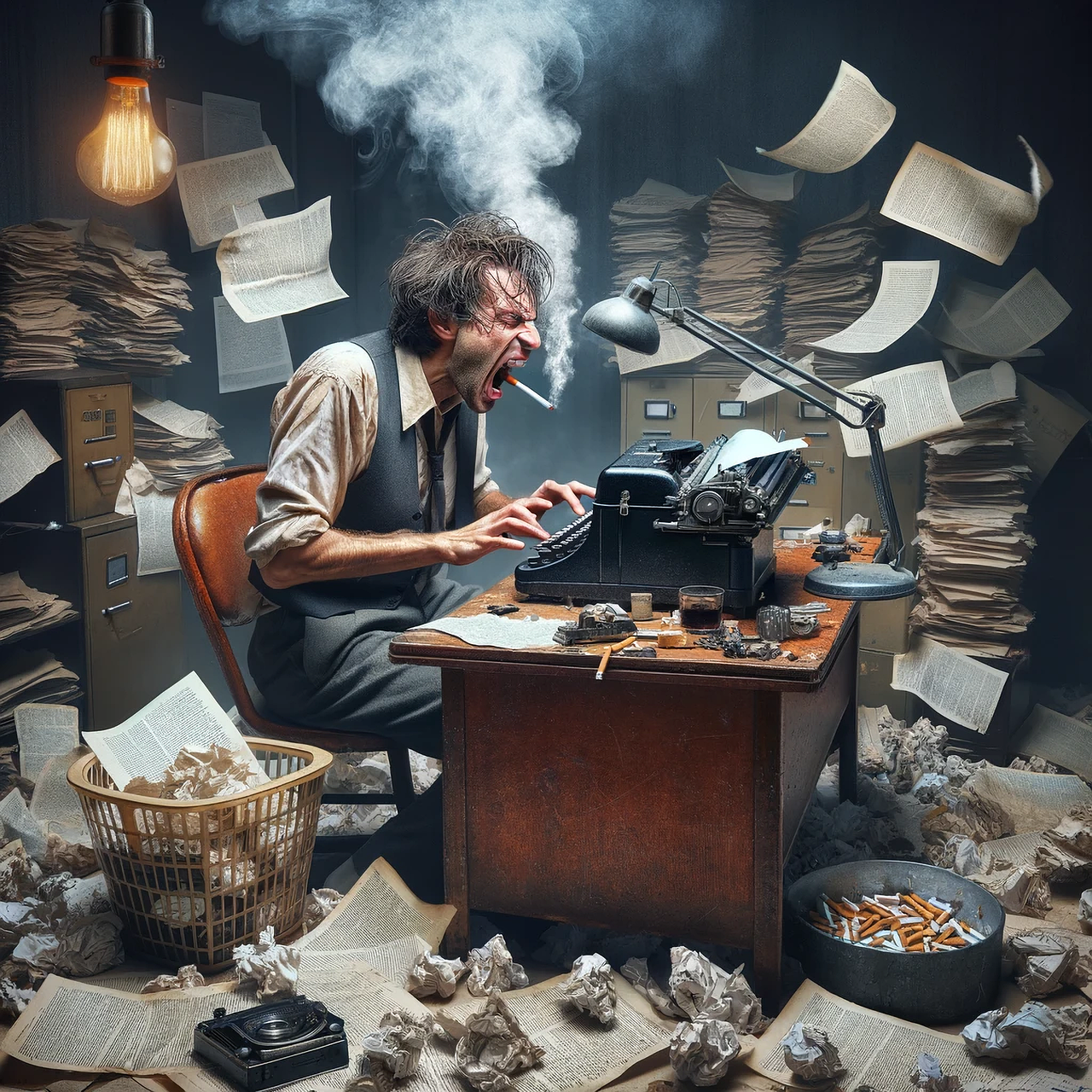
기자는 처음 이 악플을 경험했던 날 잠을 잘 수 없었다.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사에 댓글을 달고 네이버 카페에서 조롱을 했다. 꿈에 그리던 일을 하고 있지만 입사 첫 해에 세상은 기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.

물론 기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. 그런데 아직 신출내기인 내가 어떤 설명과 변명을 하든 뭔 소용이겠는가. 내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변명하고 설명하는 그 정도의 경력과 위치를 가지지도 못한 상태인데 말이다.